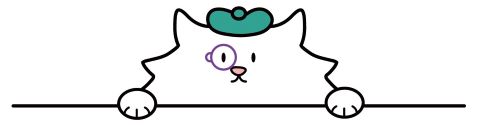
에세이 메일링캣
"Shelley"
2021년 11월-12월의 에세이
시즌5. "하늘과 바람과 별과 에세이"

시인의 에세이는 언제나 가을 🍁
매일 아침 시인들이 전하는 다감한 에세이가,
당신의 가을 하루를 반짝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올 가을, 시인들과 함께 반짝일 당신의 하루
책장위고양이의 이번 시즌(11월1일~12월31일)은 시인들의 에세이와 함께해요. 흔히들 시인은 말하지 않는 것으로 말한다고 하지요. 그런 그들이 셸집사들을 위해 그동안 아껴왔던 반짝이는 문장들을 선사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무엇도 홀로 반짝일 수는 없어요. 그것을 알아보고 읽어주는 눈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로 인해 한 존재는 비로소 반짝이기 시작해요. 책장위고양이를 구독하는 것으로, 가을 하늘의 별처럼, 시인들과 함께 반짝여 주세요. ✨
"작은 것 하나 무심히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이들을 ‘시인’이라고 합니다. 하여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시인’인 것을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거나, 내세우거나 내세우지 않거나. 하여간 참 많습니다.
그중 다섯 명 시인 이름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닮은 점이 그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했고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토록 다르니, 얼마나 각양각색의 미세微細들이 모이게 될까, 이제는 흥미진진해지기까지 합니다. 저는 벌써 마음의 서랍을 몇 번씩 열어 그 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개 쓸모없다 여겨지는 세상의 부분들입니다. 분명 다른 네 명의 시인들도 그러느라 분주한 밤을 보내고 있을 테지요. 그것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실은 반짝이는 것들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반짝임을 어디다 쓰냐 하면, 작게 놀라고 그렇구나 한참 들여다보는 데 쓰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번잡함을 잊고 어떨 때는 기뻐하고 더러 공감하고 즐거워하면서.
수백 수천 수만의 시인들이 맞장구를 치면서 너도나도 마음의 서랍을 열어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섯 명 시인이 꼬박꼬박 글을 써보겠다 작정해보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당신을 초대하며_유희경 시인
🤷 시즌5에는 어떤 작가들이 함께하나요?
당신의 가을을 반짝이게 할 5명의 시인들을 소개할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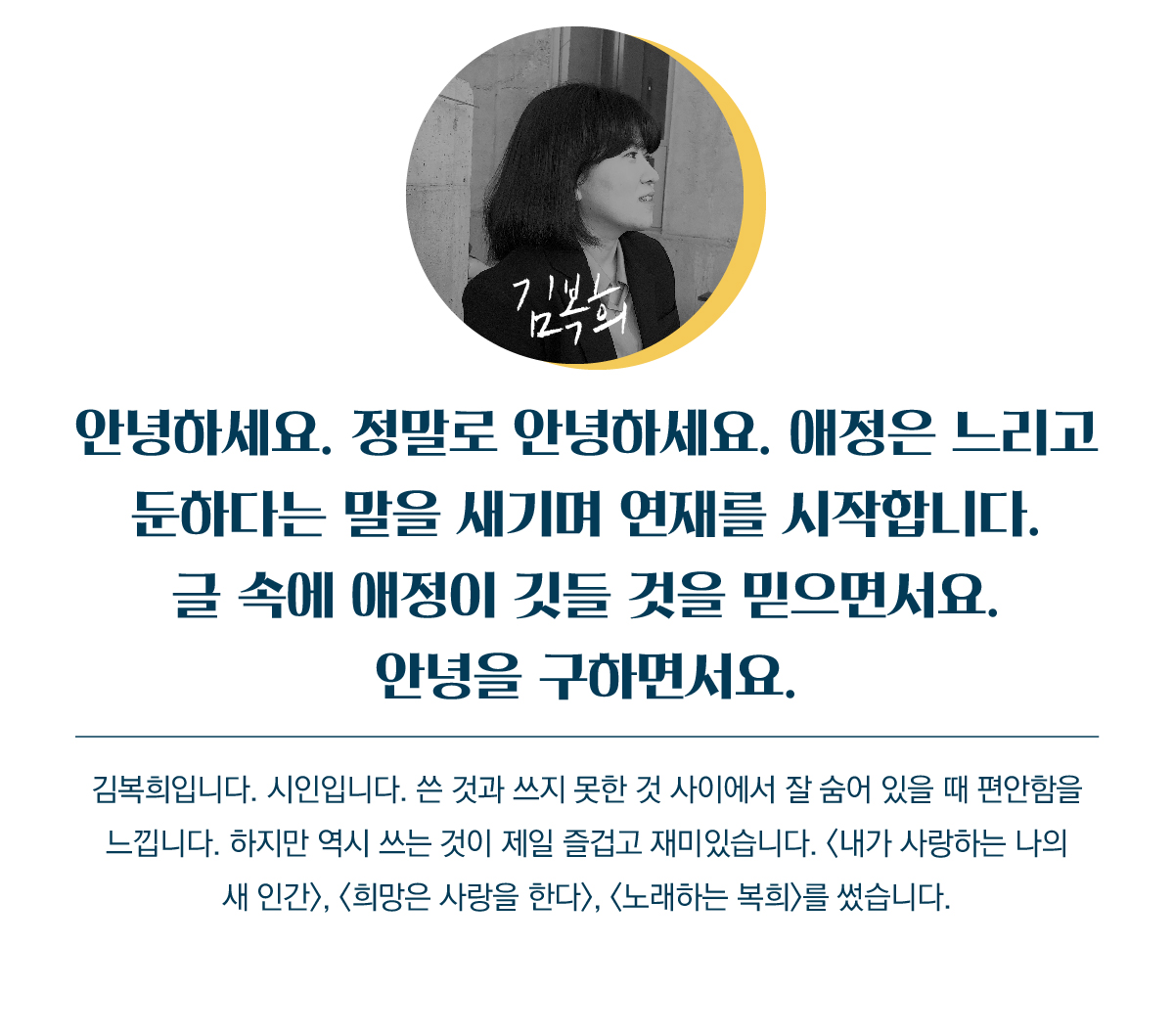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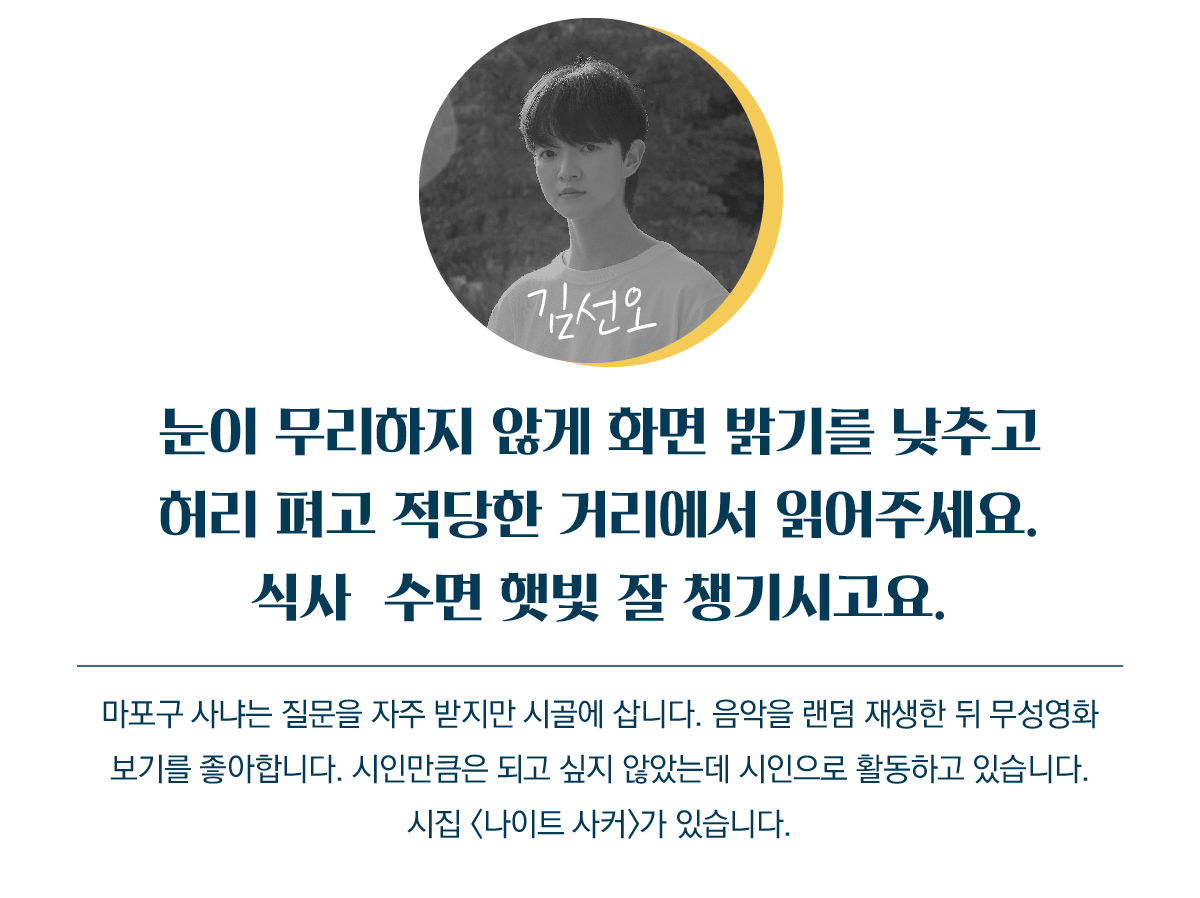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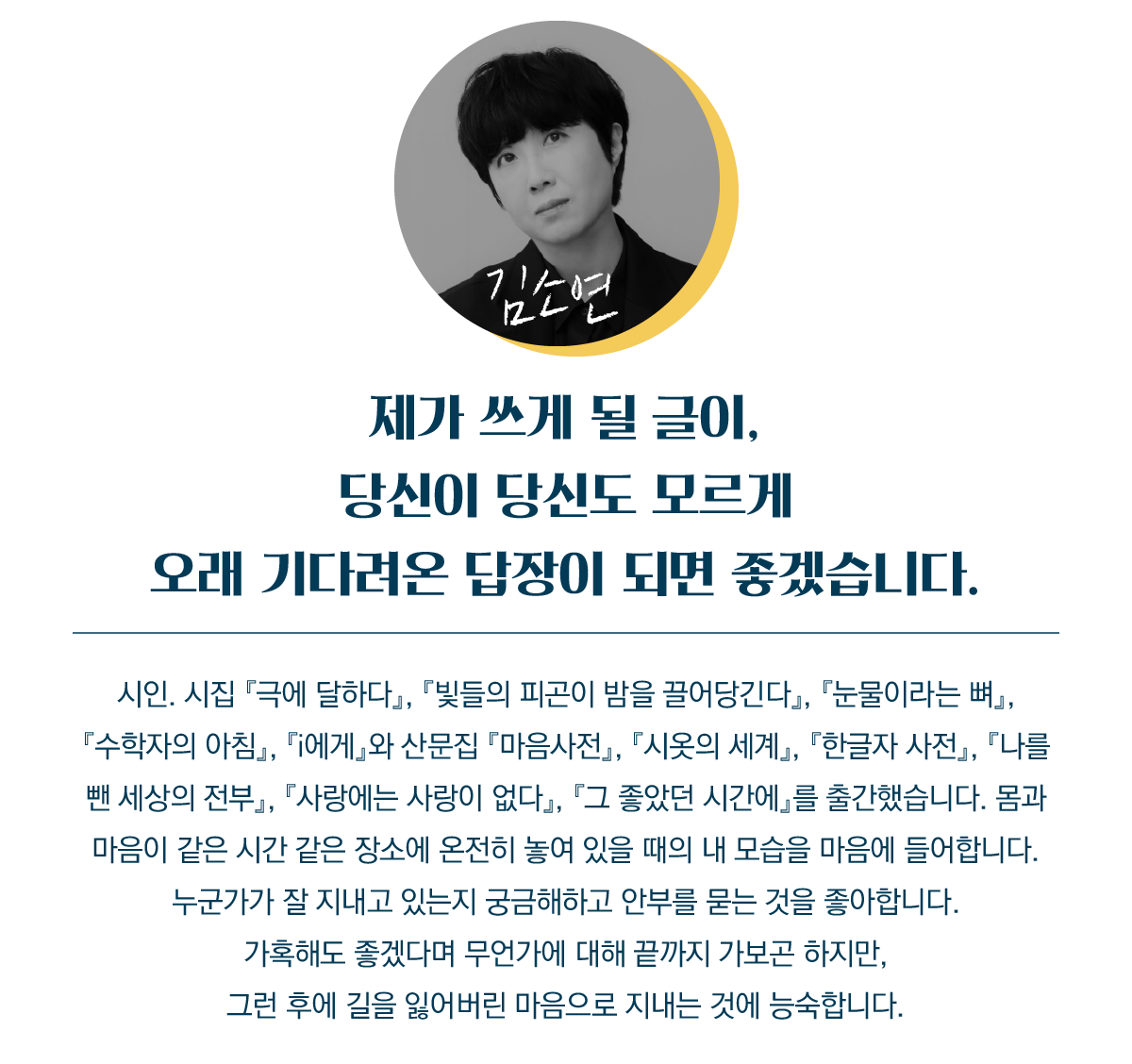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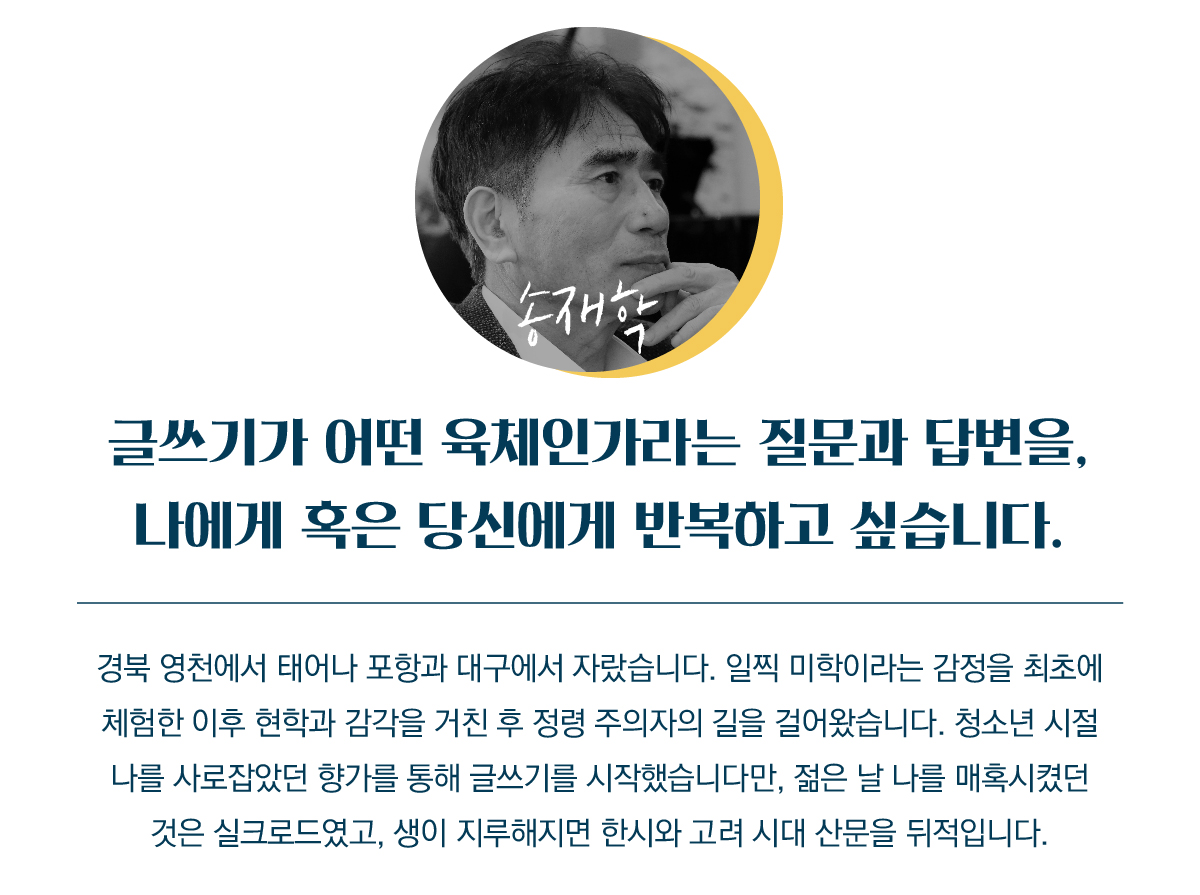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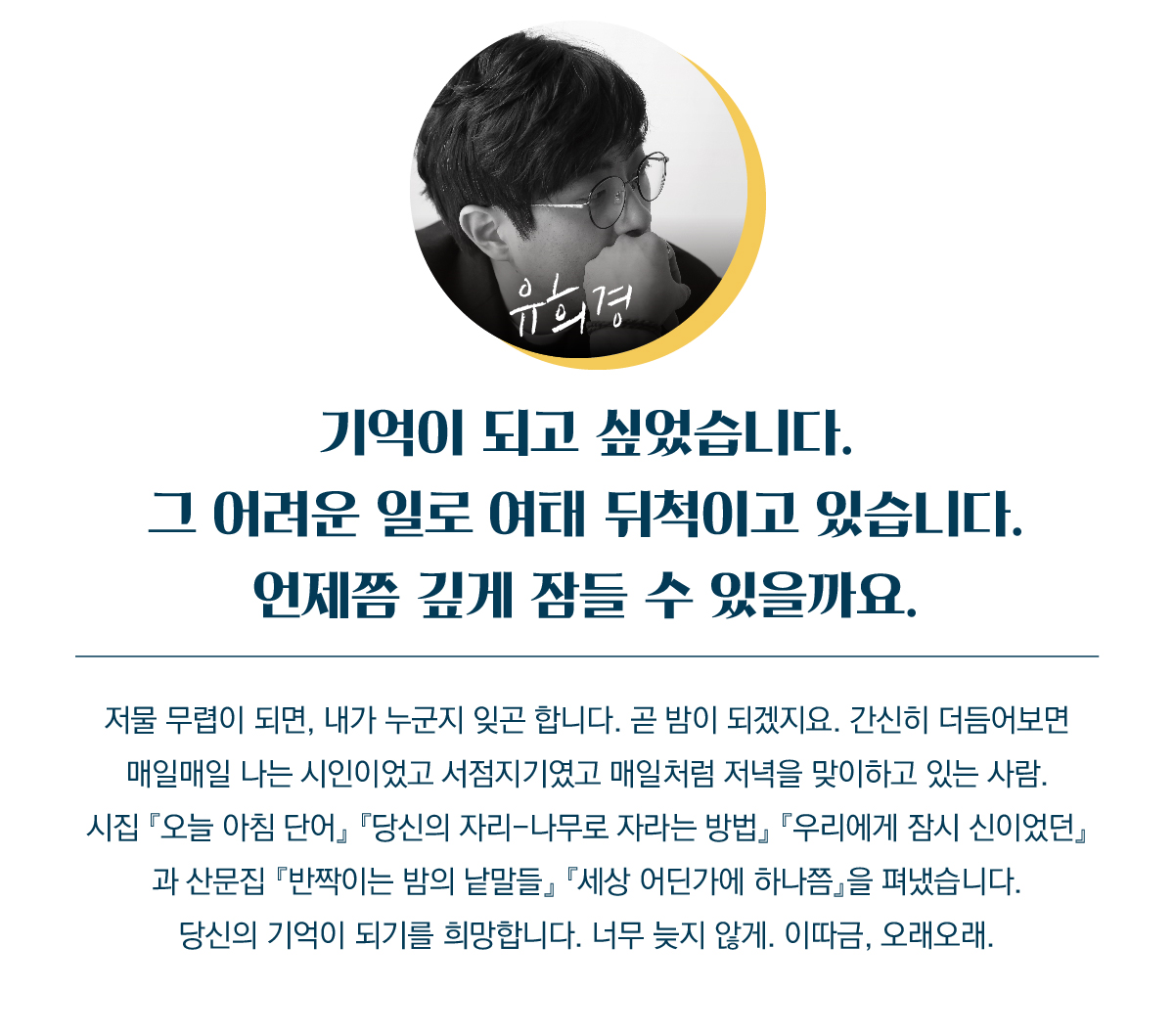
💬 시즌4 각 주차의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매주 하나의 주제로 각자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쓰게 돼요. 각 주차의 주제는 작가들이 돌아가면서 선정하고, 8주와 9주차의 주제는 셸러들이 추천한 주제를 작가들의 투표를 통해 고를 예정이에요. 각 주차의 주제는 다음과 같아요.
1주차는 셸리가 제안한 ‘첫 시집’ 📘
2주차는 유희경 시인의 ‘다 읽지 못한 책’ 📚
3주차는 김소연 시인의 ‘2030년’ 📅
4주차는 송재학 시인의 ‘아직 나를 간섭하고, 결코 지워지지 않을 유년 시절의 영화 같은 이미지’ 👧
5주차는 김복희 시인의 ‘흉터’ 🩹
6주차는 김선오 시인의 ‘음악’ 🎹
7주차와 8주차와 9주차는 셸집사 추천주제 👭
작가님들이 선택한 주제도 기대되지만 셸집사들이 제안할 주제들이 어떤 반짝이는 글들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벌써부터 기대돼요. 7~9주차에는 제안해 주신 주제들을 두고 작가님들이 중복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된답니다. 시즌 중 설문 메일이 도착하면 꼭 답해 주세요!
📆 시즌5 진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10월 25일(월)부터 10월 31일까지 사전구독신청과 사전구독자 100% 당첨이벤트를 시작해요.
✔ 11월 1일(월)부터 시즌5 에세이 배송이 시작돼요.
📆 작가들의 첫주차 에세이 한 문단을 살짝 공개합니다
피아니스트 시모어 번스타인은 세 살 무렵 친척의 거실에서 처음으로 피아노 건반을 누르며 알았다고 한다. “여기가 내 세계구나……”
세 살의 번스타인을 상상한다. 건반을 누르는 짧은 검지손가락을, 힘주어 누르는 바람에 잠시 희어진 손끝을, 의자에 앉으면 바닥에 닿지 않아 허공에 떠 있는 작은 발들을 상상한다. 박자에 맞추어 흔들리는 세 살 아이의 두 발을.
아이의 다리는 그곳에서 점점 자라날 것이다. 어느 순간 페달에 닿은 오른발은 두 손이 연주하는 여러 음을 무리 없이 연결해낼 것이다. 길어진 손가락은 점점 더 많은 건반 위를 여행하듯 자유롭게 오갈 것이다. 이러한 반복이 그의 세계를 구성할 것이다.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가 공룡이 되고 싶어 하고 경찰차를 좋아하는 아이가 경찰차가 되고 싶어 하듯 어린 번스타인은 피아노가 되고 싶었을까. 어느 날 피아노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피아니스트가 되기로 마음을 바꾸었을까. 아이들은 자라며 공룡과 작별하고 경찰차와 작별한다. 번스타인은 아흔이 넘어서도 피아노와 작별하지 않았다. 피아노는 정말 그의 세계였던 셈이다.
이제 열일곱 살의 나를 상상한다. 나는 기억력이 나쁜 편이다. 과거를 불러오기 위해 상상을 동원해야 한다.
김선오 시인의 '미래로의 회귀' 중에서
나는 시인들의 첫 시집에 대해서 유독 각별해 한다. 구입해두고 아직 읽어보지도 못한 첫 시집이 내 서재 한 귀퉁이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아무 할 일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시시하기 짝이 없는 오후를 집안을 보내는 어느 날, 한 권씩 꺼내어 소파로 가서 눕는다. 시집제목을 읽고 시인의 약력을 읽고 시인의 말을 읽고 목차를 읽고 첫 시를 읽는다. 미치도록 기쁜 시간이다. 한 개인이 자기 방식으로 입을 열어 자기 어법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내려간 세계. 다른 세계의 쪽문 하나가 활짝 열리고 열린 문으로 빛이 쏟아진다. 너무 환해서 장님이 될 것 같은 문이다. 보이는 것이 없어서 모든 걸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문이다. 마치 죽지 않은 채 죽으러 가는 문 같다. 이 세상의 모든 첫 시집들에겐 출간된다는 표현보다 남겨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정말 좋은 시집은 누군가에게 한 박자 늦게 발견되기 일쑤이다. 시집이 출간된 다음 계절에, 혹은 다음 해에, 혹은 십년 뒤에 그 시집을 우연히 읽고 환심이 일어났다면 그 시집은 그 사람을 기다려온 시집이 된다. 가장 늦게 발견해줄 누군가에 의해서 첫 시집은 태어난 명분을 온전히 갖춘다. 누군가가 뒤늦게 어떤 시집을 조우하는 일은, 그 시집이 조금 먼저 미래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시집이 조금 먼저 미래로 가 있고 독자는 조금 늦게 그 세계에 도착하는 것. 그건 시가 오랜동안 우리에게 해온 일이다.
김소연 시인의 '막연함에 대하여' 중에서
언젠가 문학적으로 어느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1988년 시집 원고를 투고했는데, 8월 어느 날 출판사로부터 시집 발행이 결정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날 저녁이 문학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첫 시집이니까요. 누구나에게 ‘처음’은 각별한 것이죠. 밤새도록 설레었어요. 그 뒤 문단 말석에서 문학상을 몇 번 수상했지만 그때보다 더한 황홀은 없었어요. 첫 시집을 낸 시기가 문학적으로 가장 고양되었을 때인데, 다만 그때가 행복하려면 평생 시 쓰기를 지속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첫 시집이 행복하려면, 평생 글쓰기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는 미래형 이야기입니다.
송재학 시인의 '첫시집의 열정에 관하여' 중에서
나의 시들은 체험이 내 내부로 들어가 나를 충분히 흔들었을 때 제 형상을 보였다. 내가 감추고 싶었던 것마저도, 감추고 있다는 티를 내면서 멋대로 흘러나와 시가 되었다. 물론 체험은 추상이었고 체험 자체로써 재현되는 것은 아니었다. 체험은 무정형인 주제에, 끝과 시작을 알 수도 없는 주제에 오묘하기까지 해서 도대체 나는 나의 체험들과 싸울 의지조차 가질 수 없었다. 나는 전격적으로 항복했다. 기꺼이 저항을 포기했다. 체험은 나를 구성하는 동시에 나를 해체하고 나를 부쉈다가 나를 다시 조립했다. 때마다의 체험이 나를 통과해서 한 편의 시가 될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한 편의 시를 쓸 때마다 나는 그 시를 쓰기 이전의 나와는 미묘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이전의 나를 낯설게 여겨야만 했다. 시를 쓰는 나는 나이면서 내가 아닌 사람으로서, 내가 이해할 수 없던 내가 수행한 체험을 추체험했다. 그런 식의 복종은 늘 새로웠다. 나는 나의 시를 읽을 때마다 그 시의 계기였던 내 체험을 다시 이해했다. 재구성했다. 어쩌면 거의 상상하기에 가까웠다.
내 첫 시집은 내가 “내 현실”을 “본다”는 것을 납득하고 수용하는 데 들인 모든 게걸스러운 노력의 난장판이다.
김복희 시인의 '나를 닮았지만 나는 아닌' 중에서
나는 내 첫 시집이 겨울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시집엔 너무 많은 눈과 얼어붙은 손가락들과 단 한 벌의 외투가 나왔으며,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나는 겨울에 시를 썼다. 꽃이 피는데도 폭염인데도 장마가 끝나고 단풍이 드는 때인데도 시를 쓰기 시작하면 겨울이 되곤 했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납득이나 체념의 방식으로 받아들인 것 또한 아니다. 시 쓰기를 그치고 나면 설령 그 계절이 정말 겨울이었다 해도, 겨울은 끝이 났고 나는 쉽게 일상으로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사실 시를 쓸 때보다 시를 쓰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상할 틈도 없었다는 게 맞겠다.
시집은 유월에 나왔다. 한여름에 눈을 맞은 사람처럼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유희경 시인의 '마른나무인간의 시절'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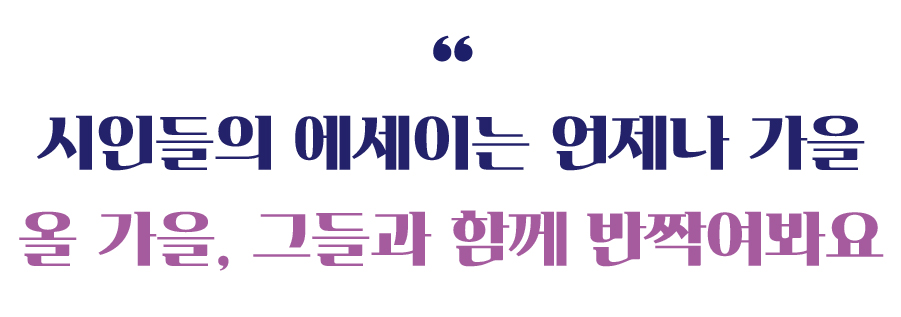







댓글 달기